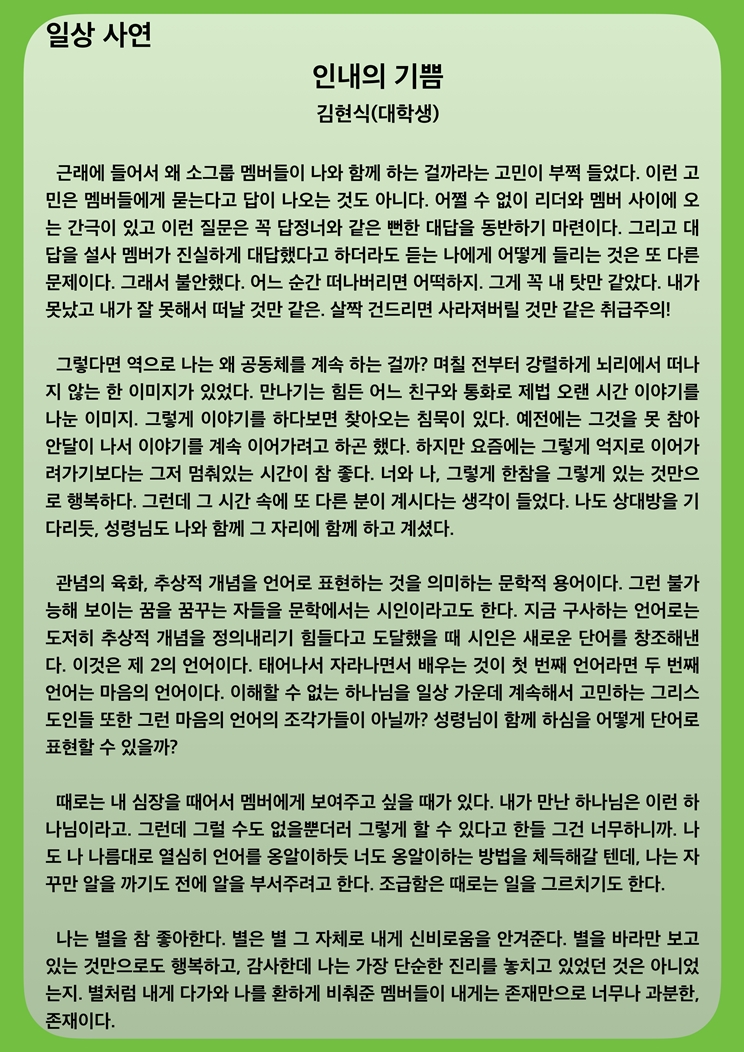나눔 2017년 6월 일상사연 - 인내의 기쁨(김현식, 대학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웹지기 작성일 17-06-01 09:26본문
인내의 기쁨(김현식, 대학생)
근래에 들어서 왜 소그룹 멤버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부쩍 들었다. 이런 고민은 멤버들에게 묻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리더와 멤버 사이에 오는 간극이 있고 이런 질문은 꼭 답정너와 같은 뻔한 대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답을 설사 멤버가 진실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불안했다. 어느 순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꼭 내 탓만 같았다. 내가 못났고 내가 잘 못해서 떠날 것만 같은. 살짝 건드리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취급주의!
그렇다면 역으로 나는 왜 공동체를 계속 하는 걸까? 며칠 전부터 강렬하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미지가 있었다. 만나기는 힘든 어느 친구와 통화로 제법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이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찾아오는 침묵이 있다. 예전에는 그것을 못 참아 안달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억지로 이어가려가기보다는 그저 멈춰있는 시간이 참 좋다. 너와 나,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상대방을 기다리듯, 성령님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다.
관념의 육화, 추상적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학적 용어이다.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꿈꾸는 자들을 문학에서는 시인이라고도 한다. 지금 구사하는 언어로는 도저히 추상적 개념을 정의내리기 힘들다고 도달했을 때 시인은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낸다. 이것은 제 2의 언어이다.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언어라면 두 번째 언어는 마음의 언어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마음의 언어의 조각가들이 아닐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 심장을 때어서 멤버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들 그건 너무하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언어를 옹알이하듯 너도 옹알이하는 방법을 체득해갈 텐데, 나는 자꾸만 알을 까기도 전에 알을 부서주려고 한다. 조급함은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나는 별을 참 좋아한다. 별은 별 그 자체로 내게 신비로움을 안겨준다. 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나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별처럼 내게 다가와 나를 환하게 비춰준 멤버들이 내게는 존재만으로 너무나 과분한, 존재이다.
근래에 들어서 왜 소그룹 멤버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부쩍 들었다. 이런 고민은 멤버들에게 묻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리더와 멤버 사이에 오는 간극이 있고 이런 질문은 꼭 답정너와 같은 뻔한 대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답을 설사 멤버가 진실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불안했다. 어느 순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꼭 내 탓만 같았다. 내가 못났고 내가 잘 못해서 떠날 것만 같은. 살짝 건드리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취급주의!
그렇다면 역으로 나는 왜 공동체를 계속 하는 걸까? 며칠 전부터 강렬하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미지가 있었다. 만나기는 힘든 어느 친구와 통화로 제법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이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찾아오는 침묵이 있다. 예전에는 그것을 못 참아 안달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억지로 이어가려가기보다는 그저 멈춰있는 시간이 참 좋다. 너와 나,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상대방을 기다리듯, 성령님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다.
관념의 육화, 추상적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학적 용어이다.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꿈꾸는 자들을 문학에서는 시인이라고도 한다. 지금 구사하는 언어로는 도저히 추상적 개념을 정의내리기 힘들다고 도달했을 때 시인은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낸다. 이것은 제 2의 언어이다.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언어라면 두 번째 언어는 마음의 언어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마음의 언어의 조각가들이 아닐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 심장을 때어서 멤버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들 그건 너무하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언어를 옹알이하듯 너도 옹알이하는 방법을 체득해갈 텐데, 나는 자꾸만 알을 까기도 전에 알을 부서주려고 한다. 조급함은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나는 별을 참 좋아한다. 별은 별 그 자체로 내게 신비로움을 안겨준다. 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나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별처럼 내게 다가와 나를 환하게 비춰준 멤버들이 내게는 존재만으로 너무나 과분한, 존재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